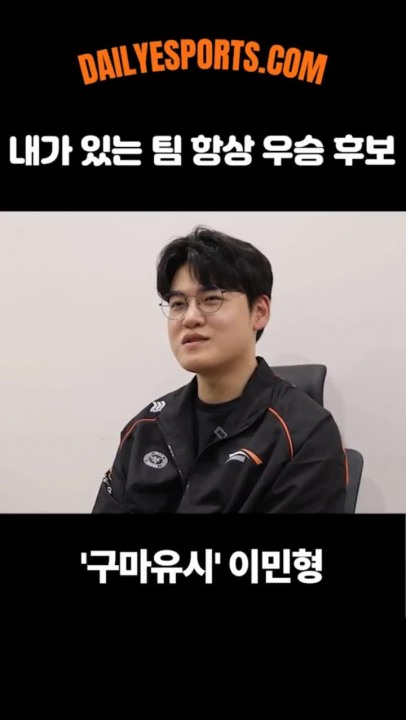그러나 유저들은 여전히 냉담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못 믿겠다'는 반응 일색이다. 다른 규제안에는 업체들 편을 들어주던 유저들도 이번만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길 수 없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반응에 힘 입어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게임정책은 네거티브 방식이다. 정부서 하지 말라고 못 박아둔 것이 있고 이를 제외한 모든 것이 자유다. 반면, 우리는 정부 정책을 따르게 하는 허가 방식이 많다.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을 위해 ~ 해야 하고'라는 식이다. '무엇 무엇을 하지 마라'와 '무엇 무엇을 해라'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180도 다르다.
'하지 마라'는 언급한 대로, 그것만 안 하면 된다. '해라'는 말 그대로 그것을 꼭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보자,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게임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법이다. 전형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괜찮다. 만약 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 해야 한다'라는 식의 막연한 문장으로 돼 있으면, 기업들은 무엇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인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하지 말라'는 주문을 사람들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공개된 자율규제안은 세부 사항을 정해두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네거티브 방식은 아니다. 유저들이 못 믿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해도 때에 따라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게임 업데이트에 맞춰 아이템을 추가하고 일정부분 드랍 확률을 조절하는 것도 사실이다. 자율규제를 좋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기에 구속력이 약할 것이란 판단도 불신에 한 몫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만은 하지 않겠다'는 네거티브 방식을 써보는 게 어떨까. 유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확률변경' 이라든지 '잡템뽑기' 같은 거 말이다.
확률은 일어날 가능성이다.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지만 연속해서 뒷면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확률이다. 그러나 표본이 많아지면 50%에 근접하게 된다. 게임 속 희귀하고 비싼 아이템이라도 반드시 나온다는 믿음만 있었다면 지금 같은 불신이 생겼을까. 지금 업체에겐 무엇을 하겠다 보다 이것만큼은 안 하겠다는 선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