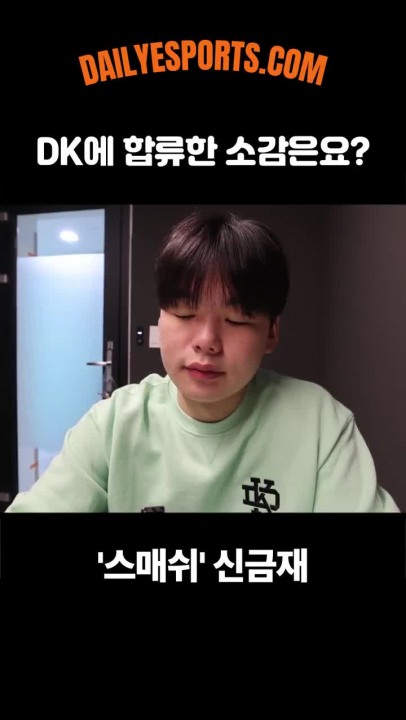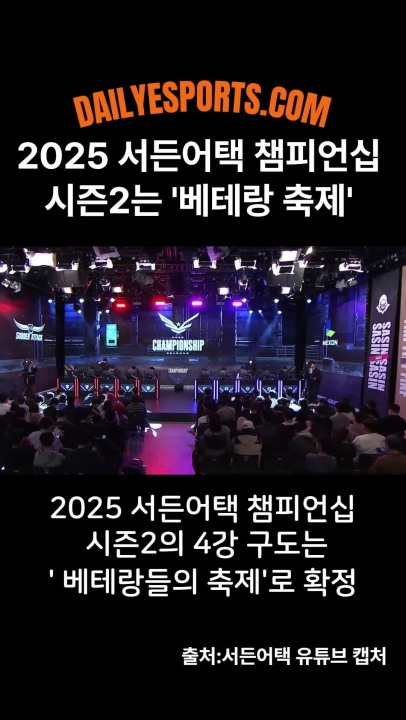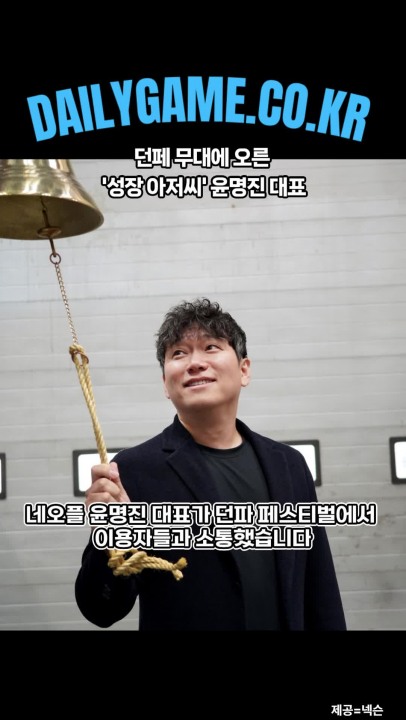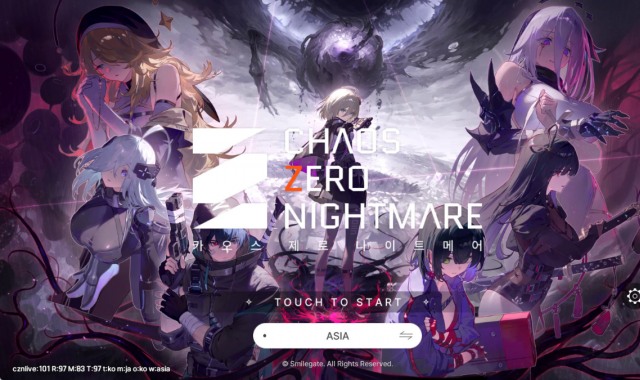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새로 등장한 게임이 과거의 기억을 덮고, 소중했던 경험도 흐릿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렇게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은 레트로 게임이나 옛 자료를 다시 찾아 나서며 자신만의 게임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게임 전문 출판사 스타비즈를 운영하며 관련 서적 출간에 힘쓰고 있는 홍승범 대표와, 게임 개발자이자 디지털게임연구학회 한국지부(디그라 코리아) 이사로 활동 중인 오영욱 개발자도 그런 활동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두 사람 모두 '기록'이라는 행위에 각자의 방식으로 몰두하고 있다.
스타비즈 홍승범 대표는 "어릴 때부터 게임이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위로 누나 셋이 있었고 나이 차이가 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자연스레 게임을 즐기게 됐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PC통신 '천리안' 게임 동호회 활동을 하며 본격적으로 빠져들었다"고 게임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지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도 40년 가까이 게임을 즐겨왔고, 그 애정은 자연스럽게 게임 서적 출판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홍승범 대표는 "좋아했던 문화, 그중에서도 '놀이의 향수'를 출판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며 "어릴 때 프라모델, 문방구 보드게임 같은 것들을 복각하거나 아카이빙하는 건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놀이 문화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중적인 기획서부터 전문 연구서적까지 다양한 출간을 이어왔지만 시장은 여전히 좁고 척박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그는 "출판사 운영만 놓고 보면 수익성은 매우 낮다"고 인정하면서도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욱 이사 역시 게임과의 관계에 대해 "게임 없이는 인생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초등학생 시절 게임을 만들고 싶어 컴퓨터 학원에 찾아갔고, 대학 진학과 직업 선택까지 모두 게임을 중심에 두고 결정했을 만큼 인생의 주요 선택지에는 게임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후 개발자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인공지능의 게임 개발에 대한 활용 연구등에도 참여 중인 오영욱 이사는 "지금도 게임으로 밥벌이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오영욱 이사가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은 두 번의 계기가 있었다고. 그는 "한 번은 당시 여자친구가 '왜 우리나라에는 정리된 게임 역사가 없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고, 또 한 번은 지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이름 없는 개발자들의 기록이 사라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을 때였다"고 말했다. 이 두 번의 계기 이후 게임 잡지를 스캔해 디지털 자료로 모으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며 4~5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자료가 쌓이게 됐다.

오 이사는 "개발자들이 어떤 시대 배경 속에서 어떤 게임을 했는지, 그 기록이 있으면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다"며 "어떤 게임을 통해 자신의 게임을 만들 계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흐름을 설명할 근거가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식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e북 프로젝트로도 자신의 작업을 확장 중이라 소개했다.
한편 두 사람은 "게임은 문화"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그 문장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홍승범 대표는 "게임이 문화라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은 이미 문학, 미술, 음악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메타버스나 샌드박스처럼 간접 체험을 유도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누군가는 이를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설명해야 하는 만큼 더욱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오영욱 이사는 더 나아가 "게임을 문화라고 하면 신성한 무언가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어떤 문화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게이밍 커뮤니티 내 혐오 문화나 배제의 문제도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포괄해 대안을 찾으려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도 하지 않기에 우리가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는 두 사람은 수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기 위한 실험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 '게임의 기록'은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작업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의 게임을, 그리고 내일의 문화를 위한 준비 단계로 차근차근 이어지고 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