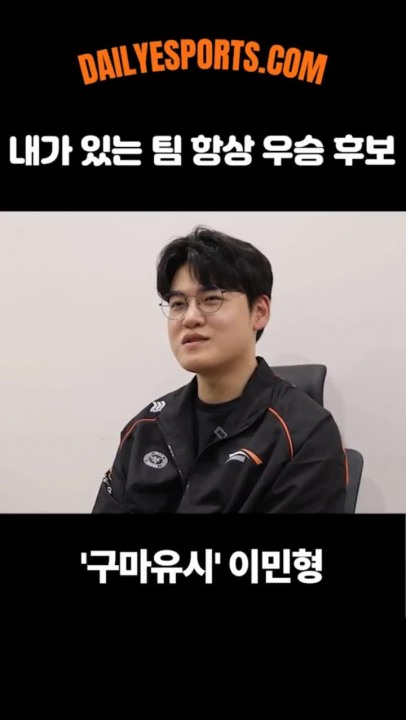성남시의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이하 AI 공모전)' 논란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 중독' 표현을 시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 협단체가 보낸 질의서도 산하 기관의 결정이었다며 선을 그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를 풀어보면 게임 중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도 의사가 자의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없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아무렇지 않게 실려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분류하기에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게임업계와 정부의 중론이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도 하다. 전 세계가 멈췄던 코로나19 시기, WHO는 '집에서 게임하라'고 권고했다. 게임이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이라면 이런 권고를 할 수 있었을까?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이 배턴을 이어받아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 법은 2022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창작물로서의 게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조치였다. 업계는 이에 따라 제도적 지원 확대와 인식 개선을 기대했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게임을 예술이자 문화로 보는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게임=중독'이라는 프레임을 고수하며 시정 요청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다. 표현을 바꾸는 일이 정책 전환만큼 큰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처리가 느릴까. 무엇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의 공문을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모는 게 '실수'가 아닌 '선택'처럼 느껴진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와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외면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보는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모습이다.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든지, 정당한 이유와 함께 명확한 입장을 밝혀고, 게임업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뜻이 어긋났다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때로는 침묵이 큰 목소리보다 무서울 때가 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